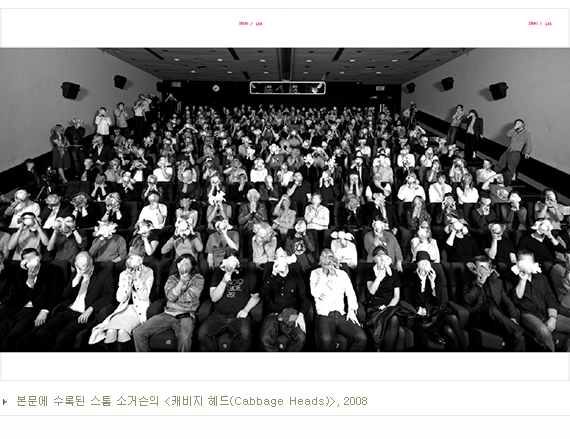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떼기
아드리안 쇼네시 | 2015-06-19
천진하게 미적 자질만을 앞세우는 예술가에게 있어 디자인 산업의 시장 논리란 가혹할 수밖에 없다. 디자이너에게 창작이 과업이라면, 비전공자들과의 충돌은 숙명이기 때문이다. 이 거친 전장에서 생존하려면 전략이 요구되지만, 출전 경험이 부족한 병사로선 내게 어떤 무기와 장비가 필요한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는 절륜한 명장이 디자인 신병들에게 건네는 병법서 같은 책이다.
에디터 | 나태양(tyna@jungle.co.kr)
자료제공 | 세미콜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틀렸달 건 아니지만 어쩐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말이다. 클라이언트는 자꾸만 폰트를, 컬러를, 크기를 바꿔 달라며 작업물에 가윗날을 들이댄다. 정녕 디자인에 ‘리스펙트’란 없단 말인가! 디자이너의 수준을 탓할 상황은 아니다. 디자이너들은 미적 직관과 예민한 감수성을 타고난 데다, 마음속 관념을 시각화하는 기술까지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다. 그러니 꽃길이 펼쳐지길 기대했던 디자이너라면 무력감에 빠질 법하다.
애당초 디자인을 잘한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는지 모른다. 애석하게도 지구촌에는 인구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미감이 존재한다. 천재적인 미학자들과 철학자들조차 미(美)에 대한 규정을 두고 수 세기에 걸쳐 피 튀는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건 너의 주관적인 취향일 뿐이야’라고 일축해버리면 그만, 천하를 통일할 미적 규격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자 영국 출신 디자이너인 아드리안 쇼네시는 화려한 이력을 뽐낸다. 1988년 공동 창립한 디자인 회사 ‘인트로(Intro)’를 15년간 운영했고, 독립 후에는 디자인 에이전시 ‘디스 이즈 리얼 아트(This is Real Art)’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다. 저널리스트로서 〈아이(Eye)〉, 〈디자인 옵서버(Design Observer)〉 등 디자인 잡지에 꾸준히 기고하고 몇 권의 단행본을 펴냈으며,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지도교수로 그래픽 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다.
요컨대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디자이너가 편찬한 그래픽 디자인 편람이다. A부터 Z까지, 키워드를 알파벳 순으로 배치한 백과사전식 구성을 취했으나 그 내용물도 딱딱할 거라는 예상은 삼가시라.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디자인을 시작한 아드리안 쇼네시는 실무에 밝은 디자이너다. 풋내기 시절부터 수천 번 무두질 당하며 깨친 바를 풀어낸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는 비단 한 디자이너의 경험담 이상이다. 대담하게 사례를 들춰내고 권위 있는 레퍼런스를 실어 나르는 동안 각 분야에 포진한 쇼네시의 지인들은 전문적인 조언으로 힘을 더한다.
제법 두툼한 한 권의 책 속에서 쇼네시는 실무와 이론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묘기를 부린다. 용어, 스킬, 글자꼴을 비롯하여 로컬 디자인의 계보, 디자인 운동의 흐름, 부문별 디자인에 대한 개괄은 기초 디자인 상식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포트폴리오’, ‘첫 일자리 구하기’부터 ‘일거리 찾기’, ‘스튜디오 매니지먼트’에 이르는 유용한 팁들로 디자이너 지망생과 중견 디자이너 독자층을 아우른다. 단순 실용서인가 싶으면 미학에서나 다룰 법한 이론들(‘기호학’, ‘키치’, ‘아방가르드’, ‘모더니즘’ 등)과 삶의 일반론(‘부러움(Envy)’, ‘윤리(Ethics)’, ‘시대정신(Zeitgeist)’ 등)으로 리듬을 불어넣는다. 하나의 키워드로 책도 쓸 만큼 파워풀한 주제를 132개나 싣고 있기에 각각은 개략적인 수준이지만, 쇼네시의 수수하고도 직설적인 문체에는 일반적인 개론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관이 살아 있다.
그러나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의 진가는 디자인 업계의 지형도를 읽는 쇼네시의 혜안에 있다. 그는 현업 디자이너의 삶에 펼쳐지는 굴곡들을 알고, 그 고비를 합리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자신조차 산전수전을 두루 겪으며 축적한 노하우에는 디자이너가 체질적으로 결여하기 쉬운 ‘사업가적 수완’이 있다. 그는 디자이너라면 한번쯤 봉착할 문제들에 논리적으로 접근해 명석한 처방을 내린다.
가령 이런 것이다. 첫째,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는 영원한 앙숙인가? 쇼네시의 대답은 ‘No’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스스로 알아보리라 기대하지 말자. 클라이언트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며, 결과물이 왜 좋은지를 설득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곧잘 도외시되는 프레젠테이션, 작업 의뢰서, 제안서야말로 그들이 연마해야 할 ‘설득의 기술’이다. 디자이너는 영원한 ‘을’이 아님을 염두에 두자. 진행 과정을 틈틈이 공유하며 신뢰도를 쌓고, 나쁜 클라이언트와는 관계를 정리하고, 노 페이 경쟁PT 같은 ‘열정 노동’은 거절하라. 디자이너는 충분히 클라이언트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존재다.
둘째, 디자이너에게 돈은 중요한가? — ‘Yes’. 돈 문제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골칫거리다. 완고한 예술혼(?)은 셈을 하고, 입금을 독촉하고, 비용을 협상하는 따위의 일을 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은 ‘업(業)’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영리하게 운용해야만 한다. 쇼네시가 ‘은행’, ‘지불 독촉’, ‘임금’, ‘돈’ 등 디자인 자체와는 무관한 키워드에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는 이유다.
셋째,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디자이너에도 이론적 탐구가 필요한가? 그렇다. 읽고 쓰는 일은 비평가나 칼럼니스트만 하는 일이 아니다. 실제 작업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쇼네시에 의하면 더 나은 그래픽 디자인 생태계를 위해서는 담론이 오고 가야만 한다. 이론화야말로 그래픽 디자인이 예술이라는 축을 놓치지 않도록 근력을 길러준 장본인이다. 모든 예술에는 정치·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매체로서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그래픽 디자인은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지위에 머물렀을 것이다.*
* 쇼네시는 본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같은 시기에 이론의 렌즈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큰 분야는 편집된 지면에서 그저 공백을 채우는 장식적인 기술로 축소되었다(물론 그 위상은 다시 변화하고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자기반성의 시기로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쇼네시가 궁극적으로 전수하고자 했던 바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상적인 애티튜드인지 모른다. 퍽 실용적인 정보지만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를 ‘무엇무엇하는 수십 가지 방법’ 식의 자기계발서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의 ‘하우 투(how to)’에는 신출내기 디자이너들이 한두 번이라도 덜 넘어져 가며 걸음마를 배웠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 디자인 사용 설명서〉에 담긴 132가지 키워드는 이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 장비인 셈이다. 그러나 쇼네시를 롤모델 삼아 모방하는 것만이 진리는 아닐 테다. 모든 그래픽 디자이너에게는 각자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픽 #서적 #그래픽디자인사용설명서 #아드리안쇼네시 #세미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