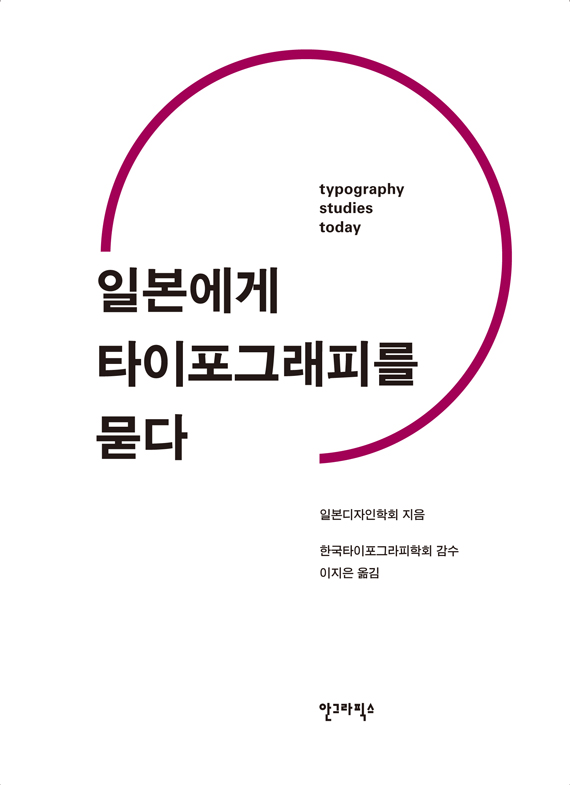2만 자의 고민
일본디자인학회 | 2011-06-14
가타가나, 히라가나, 한자, 로마자까지 사용하는 일본에서 폰트를 디자인하려면 적어도 3천자, 인쇄용은 2만자의 글자가 필요하다. 시대가 디지털화 되어서 예전처럼 일일이 글자를 그리진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들이는 정성이 이 정도쯤 되면 폰트 디자인은 가히 육체노동이라 불러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로마 알파벳과 고유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퍼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안그라픽스의 신간 『일본에게 타이포그래피를 묻다』는 우리보다 일찍 이런 고민을 시작한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디터 | 최동은(dechoi@jungle.co.kr)
『일본에게 타이포그래피를 묻다』는 일본디자인학회가 2010년 발간한 연구 성과집을 『타이포그래피 특별호』를 옮긴 책으로, 수록된 열두 편의 글은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체전문가, 타이포그래퍼, 교수들이 생생한 현장을 담아 집필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 타이포그래피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한다. 근대, 현대를 거쳐오며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와 흐름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올드로만의 대표적 서체인 ‘캐슬론체’의 윌리엄 캐슬론의 이야기, 영국의 모던 타이포그래피까지 두루 훑는다. 그 중에서도 책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일본 타이포그래피의 ‘현재’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늘어난 약시, 난독증, 노안 등의 현상과 제품의 다기능화, 소형화는 작지만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의 타이포그래피를 필요로 하는 시대의 목소리는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이니만큼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화면상에서의 가독성을 높인 윈도 비스타의 일본어 표준 서체 ‘메이리오’, 주행 중에도 글자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한 운전자를 위한 폰트, 소형 디지털 기기에서도 읽을 수 있는 ‘이와타 UD 고딕’체 등의 개발 사례를 통해 이 책은 시대의 목소리부터 진행 과정, 그 안에 담긴 고민까지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본래가 논문을 모은 책인데다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 내용은 다소 딱딱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생생한 지금 현재 일본의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일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욱 흥미로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