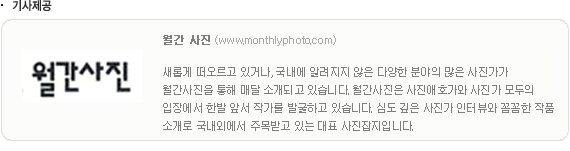예술 ‘같이’ 할래요?
월간사진 | 2015-03-20
사진이 색다른 옷을 입었다. 예술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요즘, 사진 역시 각양각색의 예술과 손을 잡고 있다. 도예, 페인팅, 일러스트 그리고 패션까지, 다양한 예술과 어우러진 사진의 새로운 탄생.
기사제공 ㅣ 월간사진
1930년대 시인 이상과 금홍을 깨우다
김용호(사진) & 김영진(한복 디자인)
사진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시인 이상.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이 만났다. 패션, 광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사진가 김용호의 이번 협업은 한국의 근대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이기도 했다. 아름지기재단이 운영하는 이상의 집(실제 이상이 살았던 집 ‘터’의 일부를 보수해 재개관한 공간)에서 진행되던 <제비다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에게 제비다방을 색다르게 해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이상의 소설 <날개>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는 이상과 그의 연인이었던 기생 금홍을 현재로 불러왔다. 영상과 사진으로 제작된 이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과 금홍을 연기할 배우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다름 아닌 차이한복의 디자이너 김영진이었다. 평소에도 20세기 초 신여성의 복장을 즐겨 입었던 그녀의 모습이 평소 김용호 사진가가 떠올리던 금홍의 모습과 가장 비슷했던 것이다. ‘날개’의 극중 인물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쳤다. 촬영 역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유롭게 서울을 누비면서 소설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를 만들어나갔다. 가장 중요했던 의상은 김영진 디자이너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녀만의 감각으로 개성 넘치는 소품과 액세서리까지 챙겨온 것이다. 김용호 사진가는 촬영을 진행하는 내내 그녀가 ‘진짜’ 금홍이 되었다고 당시를 설명한다. 2013년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이상과 그의 연인 금홍의 즐거운 한때를 담은 ‘날개 2013’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남녀의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 문제와 우울을 시대를 관통해 보여주고 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고독한 지식인, 이상의 고민과 무력감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불안과 닮아 있는 것만 같다.
런던의 소년, 그림을 입다
루이스 박(사진) & 김하영(회화)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루이스 박은 오랜 시간 해외에 거주하며 각양각색의 거리 패션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작업과 공부를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런던에서 회화 작업을 하는 김하영 작가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해오던 영국 팝아트 스타일의 작업이 런던 특유의 패션 감각이 묻어나는 그의 작업, ‘BOY+LONDON’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녀에게 협업을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번 작업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루이스 박이 자신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전달하면 김하영 작가가 그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위에 그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명의 작가가 한 작품을, 그것도 분야가 다른 작가가 함께 하는 작업이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되었고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개인전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그가 사진에 담아온 런던 거리의 소년들에게서는 특유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이 엿보인다. 그들은 단지 옷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패션’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소년들의 풋풋하고 신선한 모습에 에너지 넘치는 김하영 작가의 그림이 더해져 런던 특유의 멋이 전해진다.
글을 ‘보고’ 사진을 ‘읽다’
인준철 (사진) & 오민준 (캘리그라피)
사진에 텍스트를 덧붙인 작업은 종종 보았지만, 캘리그라피라는 예술이 더해진 작업은 나름 색다르다. 인준철 사진가와 오민준 작가는 그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같은 대학을 다녔지만 당시엔 서로의 존재만 알던 사이였다. 그러다 3년 전쯤, 오민준 작가가 일하는 캘리그라피 연구소에 우연히 인준철 사진가의 아내가 문하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재회가 성사된 것이다. 술을 즐기다 보니 만날 때마다 술에 취하고 그들만의 예술 세계에 취해 전시를 같이 열자는 말을 나눴다. 그리고 결국 이 말들이 모여 <보고 읽는다> 전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작업 과정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전시할 사진을 고르고 사진에 입힐 글귀를 고르는 과정에서 각자의 감정을 나누며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인준철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메모해둔 글, 서로가 좋아하는 노랫말, 시 구절, 때론 사진을 보고 직접 글을 짓기도 하면서 다양한 글귀는 먹으로 사진에 얹혀졌다. 먹으로 표현이 가능한 종이를 고르고 붓으로 글을 써야 하는 쉽지 않은 10개월의 작업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전시가 열렸다. <보고 읽는다> 전은 ‘글자를 보고 사진을 읽다’를 의미한다. 두 친구의 수다와도 같은 전시는 숨은 우리의 감성을 색다르게 자극하고 있다. 올해 2015년의 <보고 읽는다> 2회 전시에서 더욱 깊어진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