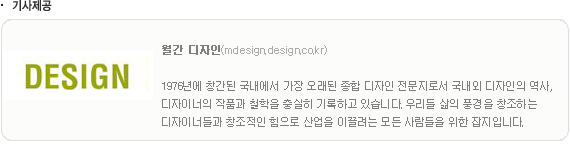핸드백을 알면 여성의 역사를 안다
2012-09-13
여성의 사치품 중 하나로 치부되는 핸드백은 사실 여성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단서다. 핸드백 디자인에 따라 당시 여성의 포즈와 디자인 소재, 기술력, 패션 경향 등을 엿볼 수 있으니 말이다. 지난 7월 19일 신사동 가로수길에 문을 연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은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역사를 한 건물 안에 집결시켜놓은 곳이다. 핸드백 전문 기업 시몬느가 주최하고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수석 큐레이터를 지낸 주디스 클라크(Judith Clark)아 큐레이팅한 박물관으로 3500여 점의 다양한 핸드백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
글│박은영 기자
기사제공│월간디자인 9월호
지난 3년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식 경매부터 전 세계 컬렉터들을 통해 수집한 작품들의 가격만해도 약 18억원. "지금도 가방은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품목 중 하나지만 16세기나 17세기 여성의 핸드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고 정다운 큐레이터가 설명한다. 거북 등껍질, 물고기 비늘 등으로 만든 손가방, 좁쌀보다 작은 천구슬을 일일이 꿰어 만든 가방, 백금과 진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바늘통 등 소재부터가 남다르다. 디자이너와 브랜드에 따라 핸드백을 선택하는 현대 여성의 기준과는 다르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 명품 브랜드의 스페셜 에디션 또한 눈을 호사롭게 만든다. 1920년대에 제작한 보석 장식의 카르티에 핸드백, 윈저 공작 부인의 이름이 새겨진 루이비통 화장품 케이스 등이 볼거리다.
가방의 크기와 디자인에 따라 당시 여성의 포즈도 상상할 수 있는데, 1920년대에 금속 소재로 손바닥보다도 작게 만든 가방은 무도회에서 춤을 추며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초현실주의가 유행할 당시에는 샴페인이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있는 듯한 위트 있는 디자인, 전화기가 달린 우스꽝스러운 가방 등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한편 가방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준 일도 있다. 세계대전 때 마을에 독가스가 퍼져 안전을 위해 방독면 가방을 들고 다니게 했는데 너무 못생기고 불편한 나머지 사람드링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은 가방을 일부러 예쁘게 디자인한 것이다.
핸드백 박물관을 기획한 시몬느(대표 박은관)는 마이클 코어스, 코치, 마크 제이콥스 등 해외 유명 가방 브랜드를 생산, 유통하는 기업으로 1987년에 설립했다. 디자인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박은관 대표가 직접 계획해 탄생한 것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박물관을 짓게 되었다고. 박물관 오픈과 함께 시몬느만의 자체 노하우와 디자인으로 만든 가방 전문 브랜드 0914를 론칭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무료 임대 공간을 운영하고, 지하 3층과 4층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수입한 500여 종류의 가죽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http://www.simonehandbagmuse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