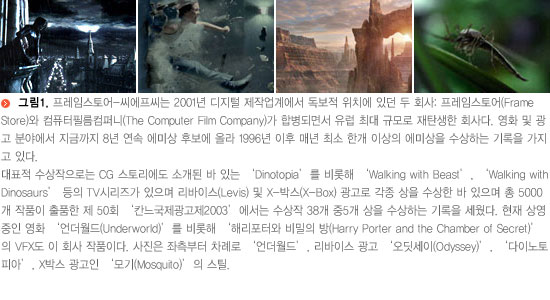수천의 인어떼가 인상적인 죠니워커 광고 ‘피쉬’
2003-10-26
언제이던가 보스톤글로브매거진(The Boston Globe Magazine)에서 컬럼니스트 히어와사 브레이(Hiawatha Bray)가 ‘Sigh-Fi’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이라는 뜻의 “Sci-Fi”를 “Sigh- Fi”, 즉 실망스러워 한숨이 나온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글의 요지는 요즘 공상과학 영화(예로 ‘X-Men 3’을 들었다)의 비주얼이펙츠가 그 기술적 완벽성때문에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 옛날 공중에 매달은 줄이 훤히 보이던 60년대 비행접시의 비행 효과만큼도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몇몇 영화에서 보여지는 완벽하기는 하나 김빠지게 하는 비주얼이펙츠의 존재에 대해 의문해 본 것이다.
공감했던 것은 기기묘묘한 디지털 생물과 감쪽같은 클린업, 절묘한 합성만으로 감탄을 자아내던 비주얼이펙츠 테크닉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첨단 CG 테크닉으로 제아무리 멋진 효과를 만들어낸들 현실감 있는 감동과 잊지 못할 인상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도데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모순된 말처럼 들리지만 “진부한 첨단” 테크닉의 위치로 낙하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반면 감동과 인상을 남기는 비주얼이펙츠 샷은 두고두고 신기해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펙츠 샷은 뜻밖으로 TV광고에서 많이 발견된다. 인상을 끌지 못한다면 그 존재가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TV광고는 자주 최첨단 테크닉의 인상성을 실험하는 장이 되며 그래서 비주얼이펙츠 테크닉을 리드하고는 한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매트릭스’의 스타일리쉬한 “플로모(Flow-mo) 효과”도 갭(Gap)의 카프리 바지 광고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기술임을 말한 적이 있던가?
그래서 이번 컬럼에서는 TV광고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비주얼이펙츠 테크닉이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라이브액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광고다. 30년이 넘도록 디지털 필름 및 비디오 테크놀러지를 선도해 오고 있는 영국의 프레임스토어 씨에프씨(FrameStore CFC, www.framestore-cfc.co.uk)(그림 1)가 감독으로 다니엘 클라인먼(Daniel Kleinman), 비주얼이펙츠 수퍼바이저로 윌리암 바트렛(William Bartlett) 및 머레이 버틀러(Murray Burtler)를 세우고 약 5개월에 걸쳐 제작한 60초짜리 광고다. 제목은 ‘피쉬(Fish)’.
‘피쉬’는 지난 6월 21일에 개최된 칸느국제광고제(Cannes International Advertisement Festival)의 알코올음료(Alcoholic Drinks) 부문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BTAA(British Television Advertising Awards) BTAA 크라프트어워드(BTAA Craft Awards) 2003의 컴퓨터애니메이션(Computer Animation) 부문 상을 거머쥔 작품이다. 유명 스카치 위스키 죠니워커(Johnny Walker)를 위한 일개 술 광고이지만 메시지에 있어서는 2001년 설립된 죠니워커의 재단 ‘키프워킹(Keep Walking – 쉬지 말라는 뜻의)’의 취지 및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서 술과 재단, 이 둘을 모두 광고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피쉬’에서 키프워킹의 취지 즉, “결연한 의지와 믿음, 그리고 인내를 가지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through perseverance, commitment, and belief, any obstacle can be overcome)”는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사는 인어들이 그들의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어 육지로 걸어나와 첫발을 내딛게 된다는 스토리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2). 잠시 그려보자면...
오프닝 씬은 드넓은 푸른 바다. 곧바로 카메라 앵글은 바닷 속을 향한다. 투영되는 빛으로 어른거리는 바닷속. 카메라는 그 속에서 무리지어 있는 물고기 떼를 비춘다. 물고기 떼를 향해 서서히 클로즈업 하는 카메라. 물고기들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실루엣임이 확인되고 손과 발을 몸에 붙인 채 유연한 솜씨로 물속을 가르며 헤엄치는 인어들의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인어들은 잠시 후 지루한 헤엄치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바다 위로 튀어오르며 질주를 시작하고 광고는 그 절정에 이른다.
물밖으로 튀어 오른 한 인어를 따라 카메라는 다시 바닷속을 비춘다. 이어서 카메라는 인어가 수영하기를 멈추고 발을 해저변에 내딛는 장면을 담는다. 해변가에 서 있는 인어들. 이제 더이상 인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서있기를 멈추고 해변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말라는 뜻의 “Take The First Step(첫발을 내딛어라)”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뜬 후 이어서 “Keep Walking” “Johnny Walker” 타이틀이 차례로 죠니워커 트레이드마크인 ‘걷는사람(Striding Man)’ 아이콘을 가운데 두고 나온다.
사뭇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가진 이 광고는 실상 사람을 여러 차례 놀라게 한다. 우선 물고기떼인줄 알고 무심코 보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람이라서 놀란다(그림 3).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손과 발을 몸에 착 붙인 채, 때로는 쏜살같이 때로는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그 폼이 그야말로 딱 상상 속의 그 인어같아 놀란다. 그리고는 지금껏 픽션에서나 존재하던 그 상상의 인어가 눈앞에 나타난 듯 싶어 어리둥절하니 입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다(그림 4).
이어서 그 사람물고기들이 돌고래마냥 바다 위로 튀어오르는데, 그게 또 장관이다. 바닷물에 젖은 머리칼을 휘두르며 서로 경주하듯 바다 위로 점프하는 이 사람같은 물고기들은 우리네로 하여금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그들만의 힘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까지 만든다(그림 5).
그런데 잠시 후 그 물고기사람들이 수영하기를 멈추고 두발로 선다. 그리고는 걸어나와 우리를 다시 멍하게 만든다(그림 6). 그 사람같은 물고기들은 땅에 사는 우리네처럼 되고자하는 의지로 걷는 사람에 대한 도전의 첫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었던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애초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사는 것에 도전해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하면서 말이다.
광고 “피쉬”의 인상성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된다. 멋진 CG와 라이브액션의 감각적인 비주얼이 하나의 현실적이면서도 강렬한 추상적 메시지로 전이돼 우리에게 모험과 도전의 의미, 즉 “키프워킹” 재단의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쉬”는 모험과 도전이라는 진부하기까지 한 이들 가치를 어떻게 이토록 극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CG에서나 가능한 인어떼와 스턴트맨의 라이브액션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또 하반신이 비늘로 덮힌 전형적인 인어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 인어떼를 그려내고자 하는 기발함이 없었다면 첫발을 내딛는 도전과 감동을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CGI가 아니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임을 증명하듯 총 50개 샷으로 이루어진 ‘피쉬’에서 디지털 손질을 받지 않은 샷은 하나도 없다. CGI수퍼바이저 앤드류 대피(Andrew Daffy)에 의하면 100% CGI부터 디지털 클린업 및 채색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손질을 받은 샷은 타이틀을 포함해 전부 55개로 실제 영화 샷 수보다 많다. 동원된 3D 아티스트만도 15명. 60초짜리 광고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숫자다 (그림 7).
‘피쉬’의 비주얼이펙츠는 크게 인어의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라이브액션과의 합성, 디지털 클린업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클린업 작업은 돌고래 점프 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스턴트맨들을 물 밖으로 튀어오르게 하기 위해 촬영팀은 스턴트맨들의 몸에 로프를 감아야 했는데 그걸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라이브액션과의 합성 작업은 해저를 배경으로 한 스턴트맨의 수영 장면에 CGI 인어들을 더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샷에서 보여지는 자연광의 투영효과를 모델들에 적용해 자연스런 합성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거의 환상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상당히 클로즈업된 수십 명의 인어들에서부터 수천개에 이르는 인어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3D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영화 ‘제임스본드 – 다이어나더데이(James Bond – Die Another Day)’에 사용했던 CG 모델을 조금 변형해 사용했다는데... 기술인즉 기본 모델의 포인트들을 조금씩 움직여 새로운 모델을 모핑해내고 그들 캐릭터에 특정 수영 스타일과 씬에 적절한 움직임을 적용한 다음 그들 캐릭터들의 포인트들을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면 캐릭터들을 무한대로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스 파킨슨(Alex Parkinson)에 의해 개발된 이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 애니메이션 테크닉은 쉽게 설명하자면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의 원화 즉, 키프레임의 정보를 이용해 중간에 들어가는 동화 즉, 인비트윈(In-between)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기술이다. 키프레임의 위치 및 형태, 표면 속성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및 라이트의 미묘한 변화까지 인터폴레이션 해낼 수 있으며 키네마틱스 및 모션패스 등의 모션 콘트롤 테크닉을 더하면 움직임까지를 정교하게 생성해낼 수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다.
원거리 샷인 인어떼와 중/근거리 샷인 클로즈업 인어의 애니메이션에는 각기 다른 방법이 사용되어야 했다. 우선 각 캐릭터의 세세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 인어떼에는 테크니컬 디렉터 앤드류 채프만(Andrew Chapman)이 개발한 마야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했다. 각 캐릭터에 하나의 파티클을 할당하고 그 파티클에 각기 다른 지오메트리와 애니메이션 사이클을 준 다음 그들 캐릭터의 모션패스를 파티클 시뮬레이터로 조정하면 변화가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덩어리로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인어떼 캐릭터의 다양화에 사용된 애니메이션 사이클은 트레블러스(Travelers), 파워킥스(Powerkicks), 제너릭스(Generics), 글라이더스(Gliders)의 네가지. 제작팀이 장난삼아 붙였다는 이들 사이클들은 각각 뛰어난 수영솜씨를 가진 캐릭터, 물을 힘차게 차며 수영하는 캐릭터, 일반적인 수영 스타일 캐릭터, 그리고 별 노력 없이 두둥실 떠다니는 느긋한 캐릭터의 특징을 대표한다.
인어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클로즈업 장면의 경우는 돌핀 점프 장면에 동원된 10명의 스턴트맨을 연구해 만들어진 무브먼트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 유연한 수영솜씨와 화면에서의 움직임 등을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고 세세하게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이브러리로 저장된 데이터는 간단한 슬라이더나 조절장치를 사용해 손쉽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우아하기까지 한 ‘피쉬’ 인어의 유연한 움직임에는 대부분 애니메이터 브랜던 보디(Brendan Body)가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사이클이 적용되었다.
인어들의 피부 및 헤어의 현실감은 제이크 멩거스(Jake Mengers)와 사이몬 스토니(Simon Stoney)에 의해 개발된 마야 셰이더를 사용해 이루어냈다. 맑은 날 풀장 바닥에 어른거리는 카우스틱(Caustic) 물 효과를 피부에 투사해주는 셰이더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바닷 속 장면인 까닭에 그 이상의 특수 셰이더는 필요 없었으며 특별히 세부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그린 페인팅을 텍스처맵으로 저장해 사용했다고 한다.
“예쁜 것이 머리도 좋아”라는 말이 있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사람 특히 여자를 가리키는 속된 말이지만 비주얼 이펙츠가 지향해야 할 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해도 무관할 듯 하다. 배우의 몸에 묶여 있는 로프를 감쪽같이 지우고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생물들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애니메이트 해 시각적으로는 흠하나 없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 이상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그 비주얼 이펙츠는 막말로 “꽝”이요, “속빈 강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관객들은 웬만한 비주얼 이펙츠 테크닉에 익숙하다. 공중 곡예를 하듯 엄청난 액션 뒤에도 땀 한방울 흘리지 않는 배우를 보면 “디지털 클린업이구만”하며 영화속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시퀀스를 보면서는 모종의 CG가 배후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웬만한 CG 기술가지고는 조그만 감동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긴박감마저 없애버리는 역효과를 내기 쉽상이라는 얘기다.
‘피쉬’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CG임이 분명한데도 관객들에게 현실적 긴박감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닷속 인어의 사뭇 불가능해 보이는 픽션을 연출하고 있지만 강렬한 리얼리티를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얼리티란 겉모습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어를 통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 리얼리티 즉, 감정이입의 리얼리티를 가리키고 있다.
똑똑하고 세련된 요즘 관객들은 CG가 아니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장면의 연출에 있어서도 CG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는 찾지 않는다. 왜냐? 관객들은 영화라는 픽션의 세계에서 논픽션 “리얼리티”를 느끼기 원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얘기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한 논리다. CG는 이제 완벽한 비주얼이펙츠 테크닉을 넘어 진정한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다. ‘피쉬’처럼 말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