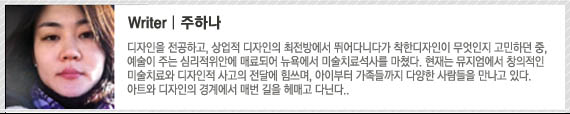현대미술의 장-아모리쇼 아트위크 NYC ②
주하나 | 2011-03-29
‘누가, 미술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내가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략 이러했다.
‘흠… 미술은 어려워’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못그려서 시도도 못해 봤지…’
‘와, 심심할 때 할 일이 있어서 좋겠다…’
누가 미술을 어렵게 만들었나? 왜 그림이 시도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나? 반면, 어떻게 그림이 단순히 심심풀이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나?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글, 사진│주하나 뉴욕 통신원
에디터 | 이은정(ejlee@jungle.co.kr)

혹자는 마르셀 뒤샹 이후의 미술이 컨셉추얼해 져서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아모리쇼 전편에 언급한, 뒤샹의 레디메이드 아트 이후의 미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왔음을 의미한다. 다다이즘의 선봉장이었던 그는 기성제품의 변기를 미술관에 거꾸로 던져놓고 ‘샘(1917)’이라고 칭한다. 또한 이 후의 작품, The Large Glass(1915-23) 에서는 커다란 유리로 된 작품을 옮기던 중, 실수로 유리가 깨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그는 이를 허용, 전시를 하게 된다. 그는 그 실수가 작품의 완성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하니, 이를 보는 일각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지 상상 해 본다.
뒤샹이 미술에 ‘컨셉’을 도입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가 미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미술계를 풍부하게 전개시켜온 장본인이며, 다각적 안목으로 실수조차 미술의 단계에 포함시키는 ‘대단한 그릇을 지닌 예술가’라고 평하고 싶다. 어느 누가 디자인의 결과물이든, 미술작품이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공들여온 자신의 ‘자식’(어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자식을 탄생시킨다 말한다)을 아끼지 않겠는가? 그러한 뒤샹의 대장부 같은 마인드로 깨어져버린 자신의 작품에 대고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 그 누가 그의 마음을 알리오.
살짝 다이그레스(digress)한 옛날 이야기는 접어두고, 미술이 생활과 멀어진 안타까운 오늘날의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을 본적이 있는가? 당신이 무엇을 보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에 대해 당신은 아마 ‘이 어메이징한 그림아!’라고 감탄할지도 모른다. 두려울 것 없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작은 인격체의 나라에선 그림 그리기에 대한 두려움이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언제부터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는지…

세 살짜리의 그림에선 올챙이가, 동그라미가 사람이다. 찍찍 그려놓고, ‘사람이야’라고 선언하면 사람이 된다. 꼬마 작가의 의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 소위 직업작가라는 사람이 아이처럼 그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Untitle, 무제’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단번에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면서도 시시해 보여서 다가가려 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거창하게 해석하려 하고 분석하려 하면서 어려워한다. 현대미술의 어려움…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식’에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Pier 92-모던 아트
전편의 기사에선 컨템포러리 아트전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기사엔 모던아트로 분류되는 Pier 92의 전시물들을 살펴보자. 아모리쇼의 컨템포러리 전시장을 돌아 2층으로 들어서면, 그라운드 레벨의 전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매료된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그림=회화’의 인식이 익숙해 지는 현장이다. 좀 더 미술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도 혹은 더 버거워질 수 도 있다. 단순이 그림이 사물의 2차원적 표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회화의 개념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적 표현으로서의 미술의 개념으로는 모던아트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림의 이미지가 더 이상 사물의 재생산이 아닌 상징적 표현으로 옮겨지니 미술에서의 기표(stand on)와 기의(stand for)-소쉬르의 언어학의 개념, 기표는 표시하는 것, 기의는 표시되는 것-로써의 이해가 필요해졌다. 그림을 통해 작가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그의 상징세계를 이해하면 좀 더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다.

흠, 소망이란다… 그리고 눈물이 벽을 타고 유리와 같은 무게로 흘러내린다. 작가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을 보는 이는, 혹은 이 글을 읽는 이는 무엇을 간절히 희망하고, 무엇에 절망하여 흘린 눈물을 닦아본 적이 있는가?
작가는 하얀 벽에 투명한 소망과 눈물을 동시에 전달한다. 근원적인 상징의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둔 채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술의 해석엔 답이 없다. 보는 이의 감상이 섞여 상징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너그러운 모습을 띤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마음이 정화되는 이 작품에 소망했던 것의 좌절을 맛보았을 때로 돌아가 잠시나마 심리적 위안을 얻어본다.

개인적으로 추상미술을 좋아한다. 이미지의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이 무한할 수 있다는 점이 끌려 선호한다. 그러나, 위의 Ciria의 작품과 같은 이미지의 강한 시각적 임팩트는 마치 ‘터져버림’, 화산폭발을 연상케 하는 공통된 인지심리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색깔이 주는 느낌, 형태가 주는 느낌이 서로 맞물려 전달하는 비주얼적인 상징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누구나 공통적인 심리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융(Carl G. Jung 1875-1961, 심리학자)이 말한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 대중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무의식은 한 사회의 개개인에게 모두 무의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원형(Archetypes- 原形)으로 한 개인만이 소유되는 것이 아닌 문화권에 속한 집단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융의 다년간에 걸친 상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현대에 이러한 무의식을 산업에 접목시킨 디자인을 왕왕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광고’업계이다. 상징적 ‘원형’ 이미지(기표)와 중첩시켜 상품의 의미(기의)를 은연중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광고 디자인의 세계는 이미, 산업이 탄생하기 전의 미술가들의 작업에서 출발했다. 현대 미술은 이처럼 디자인의 영역과 깊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처럼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에 조금이나마 질문을 던져본다.
‘아직도 미술이 어려운가?’ 라고.
2011 뉴욕 아모리 쇼를 통해 바라본 현대미술이 더 이상 어려운 남의 일이 아니길 희망하면서, 디자인과 예술 전반에서 뛰고 있는 학생, 전문가, 일반인 등 모든 사람들이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심리적 소통을 통해 뇌가 말랑말랑 해지는 장場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