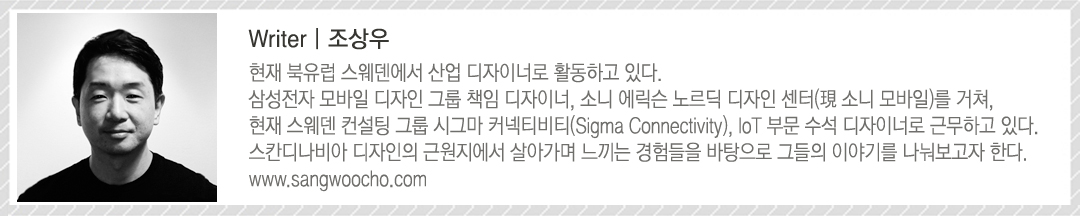시간을 디자인하다 with VOID WATCH
2018-06-28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이야기 14]
필자는 지금까지 북유럽의 다양한 분야 디자이너들과 마주 앉아 디자이너 토크(Designers talk) 세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북유럽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철학과 미래의 비전이 궁금했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혹은 노르딕 디자인의 철학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디자인에 스며드는지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 세션에서 만난 디자이너와의 시간들을 통해 필자의 편협했던 디자인 관점도 여러 각도에서 성장함을 느끼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로부터 보다 넓은 시야와 다양한 비전의 영감을 얻길 바라본다.
이번 연재의 주제는 ‘시계(Watch)’이다. 시계는 우리 일상에서 아마도 가장 익숙한 제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일상 속에 존재해 왔으며,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예전 휴대용 시계가 없던 시기에는 거리 광장의 시계탑이 그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동 중에, 혹은 시계탑이 없는 지역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용 시계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손바닥 사이즈의 회중시계, 즉 손에 들고 다니는 시계가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즈와 무게가 경량화되며 손목시계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이를 말해주듯이 시계 산업의 역사와 전통은 상당히 깊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브랜드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롤렉스(ROLEX), 파텍필립(PATEK PHILIPPE), 오메가(OMEGA), 아이더블시(IWC), 바쉐론콘스탄틴(VACHRON CONSTANTIN), 브레게(Breguet),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블랑팡(Blancpain), 사카겐(Sakagen)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부터 생소한 브랜드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회사와 그 카테고리의 라인업은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학문(?)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등장한 스마트 워치(Smart watch)는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이전 클래식 워치와는 또 다른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차세대 스마트 워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사용자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바라는 니즈가 상당히 높고 디테일함에 놀랐다. 단순히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세부 기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다.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계 디자인 분야가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계산업이 세분화되어 발전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기반된 것이리라 예측해본다. 필자가 접한 이 시대의 시계 산업은 마치 정글과도 같았다. 물론 긍정적인 이유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로 재해석한 브로슈어의 이미지 컷 ⓒ VOID WATCH
이번 디자이너 토크를 함께 진행한 데이비드 에릭슨(David Ericsson)은 시계를 그리는 디자이너(watch designer)이자, 보이드 워치(VOID WATCH, voidwatches.com)의 대표이다. 북유럽 스웨덴 출신인 그의 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시계 브랜드와는 또 다른 차별화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유니크한 디자인과 미니멀리즘을 앞세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해 오고 있다.
2008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보이드 워치(Void Watch)는 현재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재정립된 심플리시티(Simplicity)라는 이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언어는 많은 시계 마니아들에게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가 거주하는 홍콩과 스웨덴의 거리상의 관계로 이번 토크는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VOID WATCH에 대해 소개를 부탁한다.
먼저 이렇게 디자이너 토크 세션에 초대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원래 전문분야는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현재는 기업의 대표이자 시계 디자이너로 홍콩에서 일하고 있다. 보이드 워치는 2008년 홍콩에서 스퀘어 워치 시리즈(Simple square watch)를 초기 모델로 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제품이 유럽과 미주 시장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유니크한 시계 브랜드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디자이너 토크를 함께 진행한 보이드 워치(VOID WATCH) 대표, 데이비드 에릭슨(Davis Ericsson) (왼쪽)과 필자(오른쪽) ⓒ VOID WATCH
‘시계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분야의 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어렸을 때부터 시계 자체에 대해 굉장한 마니아였다. 컬렉터로서 많이 모으기도 하고 즐겨 착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시계라는 아이템은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 생각했다.
홍콩에 거주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10여 년 전에 스웨덴 회사의 제품 개발 매니저로 처음 이곳 홍콩에 오게 되었다. 그 후 가까운 중국의 생산기술력을 지켜보며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시계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정착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허브 지역인 홍콩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매력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이기에 정착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디자이너로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 바란다.
2008년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다른 브랜드는 없었다. 그 이유는 주로 대형 브랜드가 저렴한 시계들을 대량 생산하거나, 고급 스위스 시계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시계 디자인과 제조를 총괄하는 시도는 당시에는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오늘날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디자인 ⓒ VOID WATCH
필자가 본 보이드의 시계는 모던하며 때로는 레트로(Retro)적인 색채가 돋보인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적 영감은 어디서 얻는가?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적 영감을 얻는 특별한 시스템은 없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려 한다. 운 좋게도 아시아와 유럽, 북미지역을 다닐 기회가 많은데, 이 경험들을 통해 글로벌한 디자인 접근 방식을 놓치지 않으려 하며, 동시에 스웨덴, 즉 북유럽의 실용적인 디자인 감성을 담으려 한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가장 처음 디자인한 시계 V01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양산되고 있다. 약간의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현재는 ‘V01 MKII(MKII pronounced Mark II)’라는 이름으로 마켓에 선보이고 있다. 예상했겠지만 첫 디자인 양산 제품이라 그 어떤 제품보다 디테일에 공을 많이 들였고 당시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가 있는 것은 타임리스 (Timeless) 디자인의 좋은 본보기라 생각한다.
V01 시리즈는 필자 개인적으로도 선호하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도전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
‘심플하면서도 독창적인 어떤 것(Simple & unique)’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항상 도전이다. 심플은 ‘단순함’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 동시에 ‘지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확한 비율과 짜임새 있는 구성, 소재의 텍스처 등이 완벽하지 않다면 균형을 잃기 쉽다. 디자이너로서 이 조합들의 완벽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V01 MKII 시리즈의 이미지 컷. 미니멀을 유지한 레트로의 감성이 인상적이다. ⓒ VOID WATCH
보이드 워치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레트로 디자인(Retro design)이 떠오른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노스탤지어의 감성을 선호한다. 물론 과거의 지나간 경험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이 경험들을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추진력에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미래가 아닌 과거에 존재해야만 한다. 때문에 레트로 디자인이라는 표현은 선호하지 않는다. 나에게 디자인이란 언제나 현재의 시대를 말해주는 표현이다.
기존 클래식 시계업체들도 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워치(Smart watch)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보이드 워치도 계획이 있나?
아직은 없다. 가능하면 첨단의 테크놀로지와는 거리를 두려 하며, 시계 자체의 근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보이드 워치의 디자인 랭귀지와도 맞는 방향이라 본다.
컬러와 소재 선정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이미지 컷 ⓒ VOID WATCH
패션에 있어서 시계는 여전히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이다. 보이드 워치의 광고나 브로슈어 이미지 컷을 보면 역시 이 스타일링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계라는 아이템은 아주 개인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이기에 섣불리 조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의 시계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때로는 패셔너블하며 모던한, 때로는 클래식하고 조금은 올드한 스타일로 시도해보라. 시계의 느낌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패션을 코디하는 접근도 흥미로울 것이다. 시계 다이얼 판의 컬러나 디테일이 돋보이는 베젤, 다양한 소재의 스트랩 적용도 이러한 풍부한 조합을 위함이라 생각한다.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는 디자인 또는 브랜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70~80년대 빈티지 라인 시계를 좋아한다. 선호하는 브랜드는 따로 없지만 당시 세이코(Seiko)의 시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앞으로 시계 디자이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먼저 시계의 테크니컬한 측면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그래야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속을 모르고 겉만 스타일링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리고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확실하다면 비로소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계가 가진 디테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다.
보이드 워치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를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에릭슨 ⓒ VOID WATCH
심플하고 간결한 패키지 디자인 ⓒ VOID WATCH
보이드 워치의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컷, 패키지 제품 구성, 브로슈어 이미지 등에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VOID WATCH
승부를 결정짓는 디테일의 힘
휴대폰의 등장으로 인해 ‘시간을 보기 위한 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변의 지인들도 시계를 차지 않는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이제 시계는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향후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고민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앞서 디자이너 데이비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로 ‘디테일’이다. 이 디테일은 시계가 가진 외적 요소(즉 소재의 견고함, 베젤과 용두가 돌아갈 때의 기분 좋은 텍타일, 메탈 표면의 섬세한 패턴과 텍스처)일 수도 있고, 시계 자체가 가진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손목 위의 시계는 섬세하며 치밀하다. 시계라는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에도 집착해야 하는 숙명을 갖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아무리 단순한 시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숨겨진 디테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는 디테일이 주는 이야기에 열광한다. 이것은 비단 시계 분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디테일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시장에 선보이는 수많은 정교한 제품들의 등장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그만큼 높여 놓았다. 완벽한 이음새와 마감, 또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유격의 제품들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기대치가 되어버렸다. 작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무심한 배려에 감동하고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이다. 무심히 열어본 리모컨의 배터리 커버 안쪽에 깔끔하게 정렬된 텍스트와 심플한 아이콘에도 디자이너들의 손길은 닿는다(주로 소비자 안전 로고, 출시국별 전파인증 로고, 재활용 규제 로고, 지역별 다양한 인증로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섬세함은 반드시 발견되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르네상스의 미술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가 4년간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릴 당시의 일화가 있다. 천정고가 높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 어느 날은 그의 친구가 찾아와 천정 한구석의 작은 부분 채색에 전념하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이보게, 그쪽 구석은 잘 보이지도 않아. 대충 그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한다. “다른 이들은 못 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안다네.” 이 짧은 이야기는 지금의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감동적인 디테일의 요소를 이끌어내고 이를 최종 양산 단계까지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집요함이나 완벽주의적인 면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는 조금 피곤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 디테일의 결과물에 사용자들이 열광할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디자인적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디테일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보이는 제품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5년, 10년 후의 큰 인생계획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하는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_ 조상우 스웨덴 Sigma Connectivity 사 디자인랩 수석 디자이너(sangwoo.cho.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