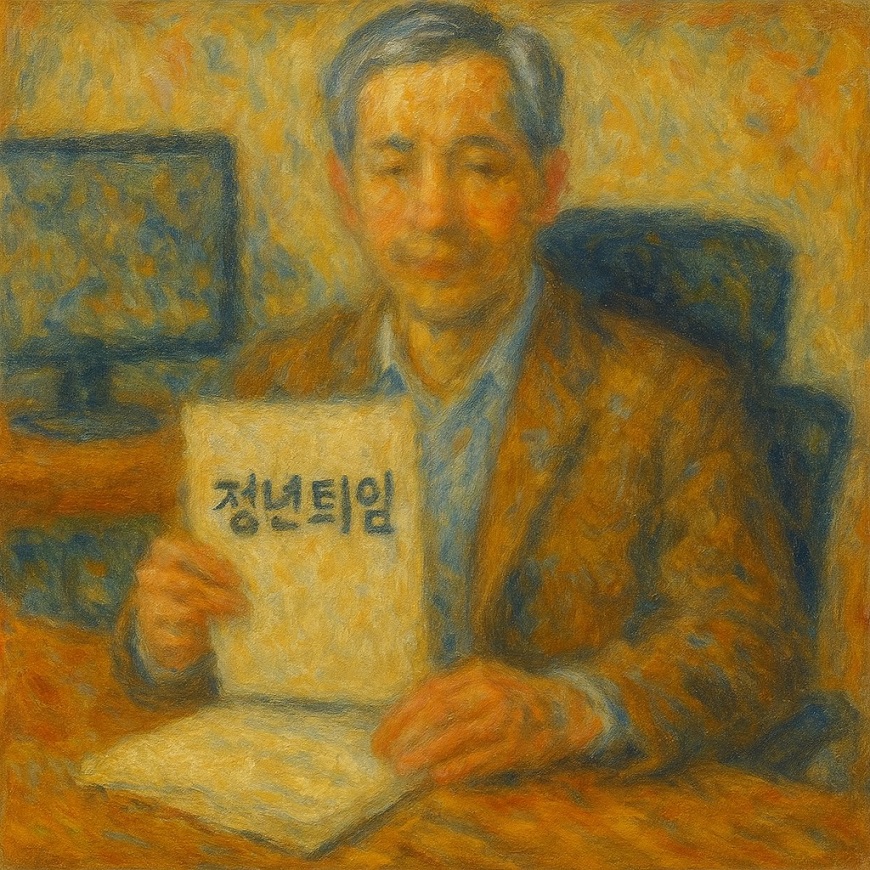[디자인정글 칼럼] “누린 만큼 돌려줄건가”_ 정년퇴임 교수들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
2025-09-05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디자인 교육의 한 시대를 이끌어온 교수들이 정년을 맞는다. 특히 1960년생 세대는 산업 고도 성장기와 맞물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들의 퇴임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다. 한국 디자인 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다. 이번 칼럼은 그들의 여정을 비평적으로 짚으며, 정년 이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주)
———
올해 정년을 맞는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1960년생, 쥐띠 세대다. 이 세대의 궤적은 곧 한국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교육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동시에 그 길은 축복과 특혜로 점철된 여정이기도 하다.
1970년대 후반, 이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산업 성장기의 정점이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은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이 아니었다. 대기업 원서를 몇 장 받아들고 ‘어느 회사에 갈까’를 고민하는 호사스러운 풍경이 흔했다. 시각디자인 전공자는 광고대행사에서, 제품디자인 전공자는 자동차·전자 대기업에서, 심지어 공예나 순수미술 전공자조차 산업 일선에서 손쉽게 자리를 잡았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뚜렷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그 빈틈을 채우듯 산업계는 다양한 전공자를 포용했다. 지금 세대가 맞닥뜨린 구조적 불안과 비교하면, 이보다 더 유리한 환경은 없었다.
1990년대 들어 정부가 대학에 디자인학과 설립인가를 대거 내주면서 상황은 더 유리해졌다. 전국 곳곳에 디자인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교수 요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석사 학위만으로도 임용이 가능했으니, 산업체 경력과 학위만 갖추면 누구나 강단으로 옮겨 탈 수 있었다. 대기업에서 밀려난 중간 관리자 출신 디자이너도, 야간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현장 경력자도 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대학은 새로운 일터이자 동시에 안락한 피난처가 되었다.
당시에는 박사학위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석사 + 산업체 경험’이 곧 교수의 자격 요건이었다. 이는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했을 때 파격적이었다. 예를 들어 공학이나 인문사회학은 이미 박사 학위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디자인 분야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이 제도적 공백이야말로 1960년대생 세대가 손쉽게 강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교수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 온 이들이 이제 와서 “못다한 꿈을 이어간다”는 말은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들이 누려온 혜택과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행보다. (그림: AI 생성)
그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학은 산업 경험을 발판 삼아 강단에 선 세대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덕분에 실무 지식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고, 이는 분명 장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학문적 깊이나 연구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졌다. ‘산업체 출신 교수’라는 타이틀은 디자인 교육을 현실에 밀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만큼 기초 연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오늘날 디자인학계가 여전히 “연구냐, 실무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의 구조적 유산이기도 하다. 산업 현장의 경험은 풍부했지만, 논문·학술지·비평적 담론의 기반은 약했다. 그 공백은 결국 후학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 세대가 정년을 맞는다.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문제는 이후의 행보다. 상당수는 퇴임 후 곧장 ‘작가 선언’을 하며 개인전이나 단체전에 참여한다. 젊은 시절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지 못했던 순수미술의 길을 뒤늦게 걷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생계를 걸고 치열하게 작업해온 전업 작가들의 자리 위에, 은퇴 교수들이 뒤늦게 합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혜택을 충분히 누린 세대가 또다시 문화적 공간을 잠식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더욱이, 교수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 온 이들이 이제 와서 “못다한 꿈을 이어간다”는 말은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들이 누려온 혜택과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행보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 출발이 단지 개인의 성취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은 한 세대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망각한 행보에 불과하다. 반대로 사회적 환원과 후학 지원을 우선시한다면, 이 세대는 한국 디자인사에 진정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문화 활동 참여, 청년 디자이너 멘토링, 공공 정책 분야 디자인 자문 등은 모두 현실적인 선택지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디자인 인문학 강좌를 열거나, 청년 창업자에게 디자인 전략을 무료로 코칭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환원은 시작될 수 있다. 산업 고도 성장기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이제 사회적 기여로 그 빚을 갚는다면, 이는 후학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1960년생 디자인학과 교수님들, 정년퇴임을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누린 행운을 이제 어떻게 사회에 돌려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야말로, 한국 디자인 역사 속에서 1960년생 세대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글_ 정석원 편집주간(jsw0224@gmail.com)
#정년퇴임 #디자인과교수 #혜택을누린세대 #산업성장세대 #교수의인생이막 #사회적책임 #후학을위한길 #디자인정글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