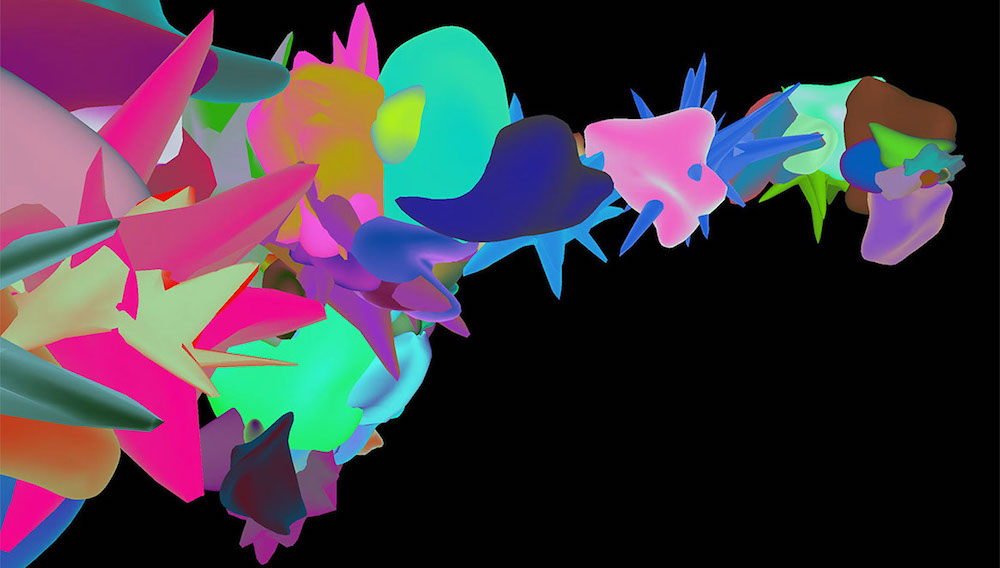[스토리⨉디자인] 디자인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2019-11-30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은 그 자체의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론에 따라 관찰되는 자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은 인간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반영일 뿐이다.”라고 걸출한 20세기 독일 이론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는 말했다.
인류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기계화 덕분에 산업혁명과 물적 풍요를 거듭했다. 지질학적 용어로 일명 ‘인류세(Anthropocene)’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대다수가 도회 환경에서 살고 자연과의 접촉 없이도 무난히 살아가고 있을 만큼 자연과 멀어졌다. 현대인의 수명은 인류사 과거 그 언제보다 길어졌고, 세련된 의학 덕분에 인간은 자연스러운 노화와 죽음까지도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가는 사이, 자연은 지금도 생사 순환의 대섭리를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은 흔히 사실 그대로 보존된 것이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사건에 대한 편집일 수 있다. 사진가 에린느 비크만스의 작품 〈구성적 기억(Constructive Memories)〉 ⓒ Erine Wyckmans
그 같은 통찰에 착안해 자연과의 관계성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약 40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시회 ‘죽은 자연, 살아있는 자연’은 ‘자연은 아직도 왕성하게 살아있다!’고 선언한다. 예술가의 창조적 비전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윤리적 양심을 창조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다. 디자이너와 건축가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품고 있는 때론 영감적인 착상을 고무하고 또 때론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실험적 연구와 실용적 해결책을 거쳐 대안을 제시한다.
때로 디자인은 ‘새로운 조형 추구’라는 이름 하에 변태적인 방식으로 자연에 개입하거나 자연물을 변형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장신구 디자이너 힐데 데 데커(Hilde de Decker)의 채소 실험 프로젝트 〈농부와 정원사를 위하여(For the farmer and the market gardener - Work in progress)〉는 성장 중인 정원 식물에 반지 같은 장신구를 끼워 자연의 적응과 변신 과정을 농경에 응용한다. ⓒ Hilde de Decker
인간 중심관이 지배해 온 20세기와 현재, 지구는 지금 기후변화와 천연환경 파괴로 몸살을 않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소비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인류는 막대한 생태적 위협을 자연에 전가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자연은 놀랍고 막강한 자기 치유력과 재생력을 지녔다.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변신, 집합, 동화, 분해하는 자연적 생로병사의 섭리를 거듭하며 느리지만 왕성하게 성장·번식·생존해 나간다.
식물계에서 잡초의 생태윈리는 인류의 이민과 유사함을 비유한 오스트리아 디자이너 로이스 바인베르거(Lois Weinberger)의 프로젝트 〈정원 채소(Garten - plantaardig)〉 1997~2003 Photo ⓒ Dirk Pauwels
‘살아있는 자연(living nature)’은 인간의 손에 꺾이고 잘리면 곧 ‘죽은 자연(dead nature)’의 흔적으로 변한다. 들판에 한들거리는 한 송이 꽃은 한 산책객의 손에 무심코 꺾이기도 하고, 수풀 속 오솔길에 놓인 곤충은 등산객의 발에 밟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자연이란 사소한 인간의 욕구나 ‘개입(intervention)’에 따라 삶과 죽음의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지극히 가녀리고 덧없는 존재란 말인가? 17세기 프랑스 화가들이 그렇게 자연에서 가져온 죽고 ‘정지된 자연물’ 들을 이리저리 배열 해놓고 그린 그림을 가리켜 정물(靜物, nature morte)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였다.
17세기 유럽 정물화 풍으로 채소와 주방집기를 연출해 사진으로 표현한 빈센트 에곤 베르쇼렌(Vincent Egon Verschueren)의 사진 〈3편의 자수(3embroideries)〉 ⓒ Vincent Egon Verschueren
일찍이 고대 로마인들은 실내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주방에 야채, 과일, 사냥감 고기, 생선 같은 식재료 그림을 프레스코벽에 그려 넣거나 다이닝룸과 거실 탁자에 신선한 과일이나 과자가 먹음직스럽게 담아 실내를 장식했다. 이어서 17세기부터 유럽 화가들이 그린 정물화 그림은 늘 신선한 과실과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던 과거 시대에 가정 실내를 시각적으로나마 풍성하게 보완해줬다. 과실과 야채는 넉넉한 집안 살림을 자랑하는 경제적 여유로움에 대한 심벌이기도 했지만, 실은 바쁘고 각박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며 살고팠던 인간 본능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체와 죽은 생물체의 흔적 사이를 오가며 시적으로 승화시킨 조각 작업을 하는 영국의 알렉시 윌리엄스의 작품 〈살상의 메아리 2(Echoes of the Kill II)〉 2019년 ⓒ Alexi Williams
이후 세월이 흐르고 정물화에 담긴 미적 깊이와 의미는 한층 더 세련돼졌다. 때론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와 나란히 배열돼 더 화려하게 상징적으로 연출된 ‘시적 감성’이자 경건한 생활윤리로 승화됐다. 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의 정물화의 황금기 시대, 정물화 애호가들은 그림 속에 묘사된 정지 상태의 죽은 자연물들-과일, 생선, 꽃, 곤충 등-과 진귀한 식기, 소라껍데기, 고서 같은 집기들이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며 인생 또한 죽은 자연과 다를 바 없이 이슬처럼 덧없고 일시적인 것이란 교훈을 되새겼다.
슈테판 숄텐과 카롤레 바이징스(Scholten & Baijings) 네덜란드의 2인조 디자인팀의 〈채소(Vegetables)〉. 천연섬유를 염색해 갖가지 채소 모양의 직물 가구, 식기, 액세서리를 만드는 수공예와 디자인의 결합을 시도했다. 2009년 ⓒ Scholten & Baijings
인간과 자연 관계 중에서도 유독 최근 주목받는 것은 인간 대 식물 생태계 간의 관계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특히 현재는 철학자, 인류학자, 대중과학 전문가들의 주도에 의한 식물의 삶과 생태에 대한 재고가 활발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한때 식물은 생태계에서 인류 생존에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졌지만, 식물도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것과 진배없는 세련된 ‘민감 지능’과 전략을 발휘하며 생존하는 존재임을 과학자들은 입증해 내고 있다.
식물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는 미생물들도 느리지만 끝없는 부활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지녔다. 버려진 귤껍질은 인간의 눈에는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테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활동을 통해서 부패-분해-변신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쳐 생태계로 환원된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린 속도로 죽은 자연을 변신시키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쉽게 편하고 빠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제 할 일을 완수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한다.
섬유처럼 자라는 식물의 뿌리의 속성을 이용해 제작된 디아나 셰러(Diana Scherer)의 유사 직물 〈인터워븐(Interwoven)〉 프로젝트 2016년 ⓒ Diana Scherer
따지고 보면 식물생태계와 크리에이티브(미술가-디자이너-건축가) 사이에는 오묘한 공통점이 있다. 두 개체 모두 정적인 무생물을 재료 또는 창조적 툴(tool)로 삼아 일한다는 점이다. 최근 농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과학자와 디자이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적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소재는 바로 버섯균사체다. 마이셀리움(mycelium)으로 불리는 버섯균사체는 버섯, 누룩 또는 그와 유사한 박테리아의 무한한 번식습성을 응용해 생태친화적 디자인 분야에서 눈여겨 본다.
‘자연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원자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작업을 성취한다’고 19세기 자연주의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썼다. 20세기 근현대사를 몸소 목격하며 자연을 연구했던 프랑스 탐험가는 자크 이브 구스토(Jacques-Yves Cousteau)가 가르쳤듯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자연과 싸웠지만 이제는 자연을 보호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와있다. 그리고 디자인계는 창조, 변신, 혁신의 열쇠를 식물의 생태와 시간에서 모색하고 있다.
아르비드와 마리(Arvid & Marie) 2인조 디자인팀이 식물의 성장 매커니즘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디지털 프로젝트 〈살아있다(Alive)〉 2018년 ⓒ Arvid & Marie
변함없는 계절변화의 섭리에 따라 또다시 돌아와 깊어가는 겨울철. 자연계가 연두와 짙녹색 성장을 멈추고 긴 겨울잠과 죽음을 채비하는 이 즈음, ‘죽은 자연, 살아있는 자연(Nature mort. Nature vivant)’ 디자인 전시회는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주력했던 20세기식 산업화와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 보라고 재촉하는 듯하다.
이 전시는 벨기에 그랑-오르뉘 혁신디자인센터(CID - Centre for Innovation and Design at Grand-Hornu)에서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계속된다.
글_ 박진아 미술사가·디자인컬럼니스트(jina@jinapark.net)
All images courtesy: CID.
#벨기에 #그랑오르뉘혁신디자인센터 #CID #죽은자연살아있는자연 #자연 #디자인전시회 #스토리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