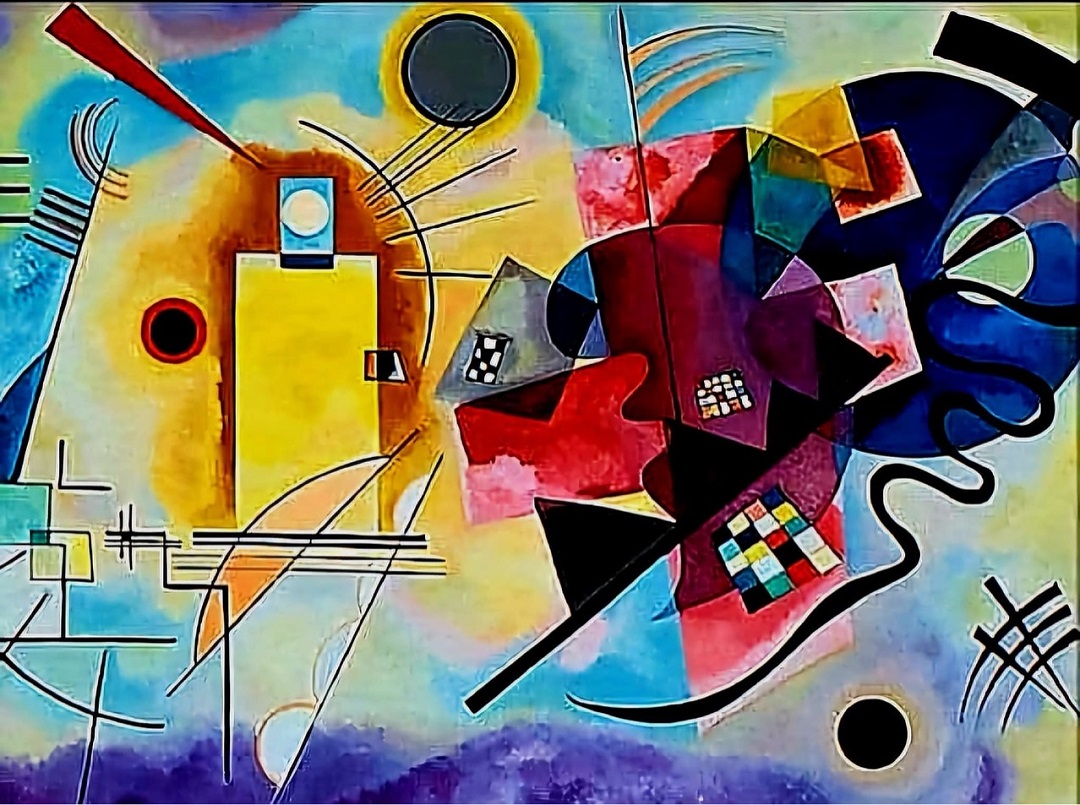[디자인정글 시론] AI시대, 미래형 디자인 기업을 중점 육성하라
2025-10-13
한국의 디자인 산업이 다시 기로에 서 있다. 1990년대 ‘디자인 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는 수십 년간 디자인을 산업화의 한 축으로 육성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여전히 ‘제조업의 부속 기능’으로서의 디자인, 혹은 ‘공공기관의 시각정비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디자인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식산업’이자 ‘창의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 중심에는 ‘미래형 디자인 기업’이 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자인의 역할은 ‘형태를 꾸미는 기술’에서 ‘의미를 설계하는 언어’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이미 수많은 시각물을 자동 생성하고, 3D프린팅이 제품 생산을 대체하는 시대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창의와 통찰의 몫이다. 즉, 디자인은 기술의 하위가 아니라 AI시대를 견인하는 창의적 인프라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디자인’을 서비스업의 부속 기능으로만 분류한다. 공공기관의 CI·BI 용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패키지 개발 지원 등 ‘외주형 디자인’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결과, 한국의 디자인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나 지식재산(IP) 을 보유한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다. 디자인을 노동의 단가로 평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자인 기업의 3가지 진화 축
이제 정부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디자인 기업을 ‘하청용역 기업’이 아니라, 제조·유통·서비스를 융합한 창의 산업체로 재정의해야 한다.
첫째, ‘디자인 제조기업’은 창의력을 기반으로 물리적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
아이디어 제품, 리빙소품, 패션소품, 캐릭터 굿즈 등 ‘디자인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고 브랜드화한다. 이들은 단순 제작자가 아니라, 디자인을 콘텐츠이자 자산으로 보유한 제조형 기업이다.
둘째, ‘디자인 유통기업’은 디자인 가치의 ‘큐레이터’다.
다양한 디자이너의 제품을 선별하고 스토리와 함께 유통한다. 편집형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디자인을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취향의 유통재’로 전환시킨다.
셋째, ‘디자인 서비스기업’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다.
브랜딩, UX·BX·공공디자인, 공간기획, 리서치·컨설팅 등,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산업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 부문이 지금까지 한국 디자인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AI시대에는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창의적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디자인 솔루션 기업’ 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 세 영역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을 융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디자인 기업은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며, 서비스를 설계하는”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AI시대의 디자인 기업은 ‘IP기업’이다
AI의 시대에 진짜 경쟁력은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재산(IP)’이다. 디자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디자인 결과물의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 노동력을 초월해 디지털 자산(IP) 으로 거래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예컨대 폰트, 캐릭터, 일러스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간디자인 데이터, 심지어 UI 구성요소까지 모두 저작권 기반의 IP 자산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디자인 기업은 이 IP를 기업 소유로 축적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 용역으로 수행되어 결과물의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다. 결국 디자인 기업은 창작의 주체이면서도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에 갇혀 있다.
이제는 정책이 ‘디자인 노동 지원’이 아닌 ‘디자인 IP 축적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디자인을 일회성 결과물이 아니라, 반복적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AI시대의 디자인 기업이란, 바로 이러한 창의적 IP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21세기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감성의 언어’에서 결정된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와 형태는 여전히 디자인이 만든다.(그림 출처: 칸딘스키 작품)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디자인 산업은 전통 제조업이나 IT 산업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작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 창의산업이다.
그러나 시장 구조는 여전히 ‘을의 산업’이다. 정부조달, 공공프로젝트, 대기업 납품 등 단가 경쟁 구조 속에서 수많은 디자인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창의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정부는 이제 디자인을 단순한 미적 기능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소프트파워이자 전략 산업으로 다뤄야 한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 디자인 기업 분류체계의 재정립
- 기존의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확장하여 제조형·유통형·서비스형 디자인 기업을 구분·인증해야 한다.
- 기업의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금융·세제·R&D·수출)이 달라야 한다.
2. 디자인 IP 자산화 지원제도 도입
-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평가, 라이선스화 과정을 제도화한다.
- 폰트, 캐릭터, 브랜딩 시스템 등 디자인 자산의 가치평가와 담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AI디자인 생태계 조성
- 디자이너와 AI가 협업할 수 있는 ‘공공 AI디자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셋, 알고리즘,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제정해야 한다.
4. 디자인 스타트업 및 프리랜서 생태계 지원
- 소규모 창의기업과 1인 디자인기업을 위한 공유 스튜디오, 펀딩, 세제, 지식재산 컨설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5. ‘디자인 산업진흥원(가칭)‘ 신설 또는 재편
- 현행 디자인진흥원은 대부분 전시·홍보 중심이다. 이제는 R&D, IP관리, AI융합, 글로벌 진출을 담당하는 ‘산업형’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이다
21세기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감성의 언어’에서 결정된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와 형태는 여전히 디자인이 만든다.
따라서 디자인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AI시대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와 창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을 산업화할 플랫폼과 정책의 부재다.
정부가 미래형 디자인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AI가 그리는 세상은 데이터로 채워지지만,
그 세상을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디자인이다. 이제 한국의 디자인 정책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AI시대의 미래형 디자인 기업을 중점 육성하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문화와 기술의 균형 속에서 진정한 ’창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길이다.
글_ 정석원 편집주간 (jsw0224@gmail.com)
<편집자주>
이 시론은 ‘디자인을 산업의 부속이 아닌 주체로 세우자’는 제안이다.
AI가 인간의 창의영역을 잠식하는 지금,
디자인은 기술의 종속이 아니라 인류의 감성을 회복시키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또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산업전략’의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I #디자인시대 #디자인기업육성 #디자인 #IP #창의자산화 #디자인산업정책 #디자인플랫폼 #디자인진흥을넘어산업화로 #서비스디자인 #브랜딩정책 #디자인정글시론